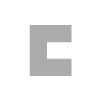네루다 시선
겨울 정원
겨울이 온다. 노란 침묵의
옷 입은 굼뜬 잎사귀들이
내게 눈부신 구술(口述)을 건넨다.
나는 눈[雪]의 책,
넓적한 손, 초원,
기다림의 원(圓).
나는 대지와 그 겨울에 속해 있다.
무성한 잎에서 세상의 소리가 자랐고,
그 뒤에 붉은 꽃들이 화상(火傷)처럼
점점이 뿌려진 밀이 불탔다.
그리고 이윽고 포도주의 문자를
세우기 위해 가을이 왔다.
모든 것이 지나갔고, 여름의 술잔은
지나치는 하늘이었다.
그리고 떠도는 구름이 사라졌다.
난 기다렸다, 유년 시절의 덩굴나무가 있는
어제처럼 한없이 침울한 발코니에서,
황량한 내 사랑 속에 대지가
날개를 펼치길 기다렸다.
장미는 땅에 떨어지고
덧없는 복숭아씨는
다시 잠들었다 발아할 것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온 바다가 밤이 되고
저녁노을이 재로 변할 때까지,
대기의 술잔에 취했다.
대지는 이제 살아 숨 쉰다,
그 의문 가라앉히며,
그 침묵의 거죽 펼친 채.
난 이제 다시
차가운 비와 종소리에 싸여
먼 길을 온 말없는 사람.
대지의 순결한 죽음에
내 발아의 의지를 빚지고 있다.
≪네루다 시선(Antología de la poesía de Pablo Neruda)≫, 파블로 네루다 지음, 김현균 옮김, 251~252쪽
모든 게 지나고 먼 길을 돌아, 겨울은 그렇게 온다. 소리도 문자도 사라지고 겨울은 침묵한다. 다시 살아 숨 쉴 새로운 씨앗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