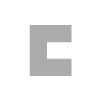초판본 김소월 시선
소월, 어디 가시나?
남편은 동아일보 지국 일을 작파한 뒤로부터 매일 술을 마셨다. 살아 봐야 낙이 없으니 함께 죽자는 말도 여러 차례였다. 그날 밤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신음 소리를 듣고 깨어 불을 밝혀 보니 아편 덩어리를 입가에 흘린채 죽어있었다. 1934년 12월 24일 새벽이었다. 열일곱에 세 살 아래인 김정식과 결혼한 홍실단이 기억하는 소월의 마지막은 대게 이러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임을 버리지 못하고 잊힌 자신을 잊지 못하는 비합리의 정서는 어찌하여 수 은 한국인의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것일까? 오도 가도 못했던 식민지의 방향감각이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일까?
往十里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왓스면 죠치.
여드래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로 朔望이면 간다고 햇지.
가도 가도 往十里 비가 오네.
웬걸, 저 새야
울냐거든
往十里 건너가서 울어나 다고,
비 마자 나른해서 벌새가 운다.
天安에 삼거리 실버들도
촉촉히 저젓서 느러젓다데.
비가 와도 한 닷새 왓스면 죠치.
구름도 山마루에 걸녀서 운다.
<<초판본 김소월 시선>>, 김소월 지음, 이승원 엮음, 88~89쪽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